아버지의 수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수진 작성일2018.02.06 조회7,611회 댓글0건본문
동해4 방면 선무 한수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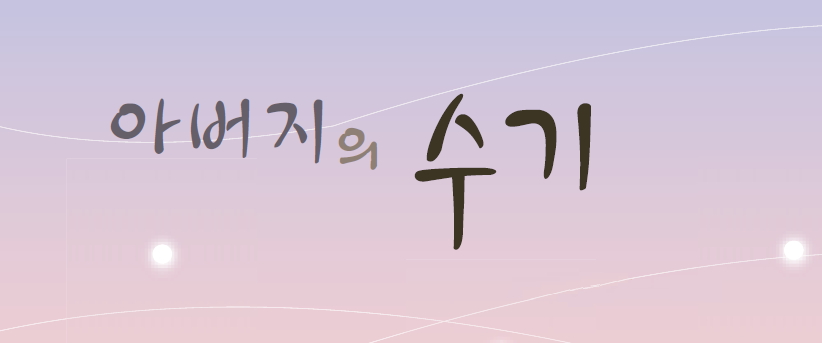
몇 년 전, 이사를 하고 났을 때의 일이다. 동생은 회사 때문에 서울에 있었고 어머니는 도장에 가셔서 혼자였긴 했지만, 오늘 안으로 대충이라도 정리를 끝내리라 마음먹고 이삿짐을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기 시작했다. 한참을 정리하다 보니 오렌지색의 낡은 상자 하나가 눈에 띄었다. ‘우리 집에 이런 것도 있었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상자 덮개를 막고 있는 테이프를 뜯어냈다. 그 안에는 예전에 발행됐던 『대순회보』가 잔뜩 들어있었다.
어린 시절에 늘 『대순회보』의 전면 사진을 보는 것을 즐겼던 기억도 나고, 오래된 신문지의 바스락거리는 느낌이 왠지 기분 좋게 느껴져서 잠시 쉴 겸 몇 부를 끄집어내어 들춰봤다. 한참 이리저리 뒤적이다가 갑자기 낯익은 얼굴이 보여서 페이지를 넘기던 손을 멈췄다. 지금보다 십여 년은 젊은, 내 아버지의 사진이었다.
그러고 보니 예전에 아버지께서 회보에 수기를 투고한 적이 있었다. 언제 그 사실을 알았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사춘기 시절에 우연히 지금처럼 아버지의 수기와 직면한 적이 있었다. 그때는 한창 아버지에 대한 애증이 들끓던 때라서 지면에 실린 아버지의 사진을 보자마자 회보를 덮어버렸다.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 잠시 고민하다가 한숨을 한 번 내쉬고 읽어 내려갔다. 글의 내용은 아버지가 해외에 계실 때 어머니가 입도를 하셨던 일부터 그 후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참 희한하게도 글을 점점 읽어 내려갈수록, 당신께서 편지로만 전해들은 상황과 당시에 우리가 겪었던 날들의 기억이 하나, 둘 떠오르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타지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언제나 편지에는 “우리 모두 잘 지내고 있으니 당신 건강 조심하세요.”라는 말만 쓰셨다.
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서부터 아버지는 항상 배를 타고 해외로 나가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아버지”라는 존재는 이름만 있을 뿐, 실제로 인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다. 거기다 해외에서의 상황이 잘 풀리지 않아서 빚만 눈덩이처럼 불어나 주변 사람들 모두가 출국을 만류했었다. 그러나 당신께서는 그 일을 하고 싶어 하시고, 결국 모든 게 잘 될 것이라며 몇 년씩 해외에 나갔다가, 한국에 돌아와 두어 달 머무른 후 다시 몇 년 동안 외국에 나가는 생활을 반복하셨다.
아버지의 부재와 그로 인한 가정경제의 악화로 인해 나는 점점 아버지를 그리움이 아닌 미움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했고, 중학생 무렵에 부모님이 별거하시면서부터는 아예 “아버지”라는 존재와 관련된 모든 것을 가슴 깊이 묻어 버렸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묻어뒀던 기억들이 조금씩 되살아나더니 막혀있던 하수도가 갑자기 뚫린 것처럼 온갖 감정들이 터져 나와 순식간에 머릿속이 엉망진창으로 변해버렸다.
한참을 그 상태로 울다보니 결국 몸을 가누기 힘들만큼 지쳐버려서 벽에 기대어 앉았다. 잠시 동안 멍하니 앉아 있는데, 문득 맞은편의 대순달력이 눈에 들어왔다. 도장 사진을 바라보다가 옆으로 시선을 옮기니 큼지막하게 쓰인 ‘훈회(訓誨)’가 보인다. ‘훈회’를 읽어 내려가는데 마음속에서 문답이 떠오른다.
“하나, 마음을 속이지 말라” 나는 정말 아버지를 미워하기만 하는 건가? 아니다. 애정이 크기 때문에 미움도 큰 것이다. 다만 인정하기 싫어서 외면해 왔던 것뿐이다. “둘, 언덕을 잘 가지라” 나는 항상 아버지에 관해서 만큼은 냉정하게 말하곤 했다. 저주성 발언을 퍼부은 적은 없지만, 누가 아버지는 뭐하시냐고 물으면 나는 그런 거 없다고 대답하곤 했다. “셋, 척을 짓지 말라” 척은 남이 나에게 서운한 마음을 갖는 것이라 했다. 그리고 아버지는 항상 나에게 서운해 하신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지어온 척의 수는 몇 ‘개’가 아니라 몇 ‘년’의 단위로 세어야 할 것이다. “넷, 은혜를 저버리지 말라” 어머니가 종종 너는 아버지에게 딸 노릇한 건 뭐 있냐며 미움의 감정을 거두라고 하실 때마다, 언제 나에게 그럴 시간이나 주셨냐고 반박해왔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내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게 해준 것, 그래서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어머니, 동생과 함께 살아올 수 있었고, 그로 인해 도를 접할 기회를 얻었다는 사실은 아무리 갚아도 모자랄 은혜를 입은 것이었다. “다섯, 남을 잘 되게 하라” 생면부지 타인도 잘 되게 해주는 것이 우리 도(道)다. 그런데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온 것일까?
훈회의 마지막 조항까지 읽었을 때, 도저히 뭔가 견딜 수 없는 기분이 들어서 생전 처음으로 내가 먼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언제나처럼 섭섭함이 잔뜩 묻은 목소리로 “네가 웬일이냐.”는 말부터 꺼내신다. 그냥 갑자기 보고 싶어서 전화했다고 대답했다.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었지만, 아버지는 기분이 좋아지셨는지 한층 누그러진 목소리로 이런 저런 근황을 말씀하셨다. 언제 울었냐는 듯 밝은 목소리로 깔깔거리며 통화를 계속 했더니, 대뜸 당신께서 아는 사람이 있어서 쌀을 싸게 살 수 있다고 하셨다. 그러더니 쌀 한 포대를 보내 줄 테니 주소를 불러보라고 하신다. 뜬금없는 말이긴 했지만, 주신다는 것을 굳이 사양할 필요도 없어서 냉큼 주소를 불러주고 감사의 말과 함께 통화를 끝냈다.
핸드폰을 책상에 내려놓고 방바닥에 펼쳐진 회보와 그 주변을 뒹구는 휴지 뭉치들을 바라보니 왠지 웃음이 났다. 지난 긴 시간 동안, 나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했던 것일까? 물론 원망이나 미움을 완전히 떨쳐낸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이제부터는 내 아버지를 외면하지는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 쌓여온 감정들을 모두 해소하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지성으로 상제님께 심고를 드리며 마음을 다스려나가면 결국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이 들었다.
나는 아버지의 수기가 실린 회보를 갈무리해서 책꽂이에 꽂아 넣고, 휴지 뭉치들을 주워 쓰레기봉투에 담았다. 그리고 손을 씻고 와서 향을 하나 피웠다. 방안 가득 퍼지는 향 연기 속에서, 나는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짐 정리를 다시 시작했다.
<대순회보 90호>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